건강, 한의(漢醫, 韓醫)/건강정보
소화돕는 식초 현미밥
윤지환 철학연구소
2012. 11. 15. 2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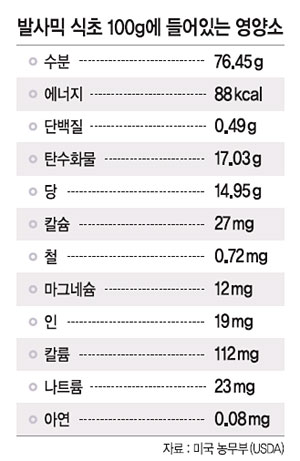

그러나 이는 역류성 식도염의 한 단면만 보고 내린 결론이다. 식도와 위장 연결부위인 하부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은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젊은 사람들 얘기다. 40∼50대 중년이 넘어서면 소화기능이 떨어진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위산 분비력의 저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위산이 부족할 경우 위산 대신 '독성 성분'이 있는 수분과 가스가 식도로 넘어온다. 이 수분과 가스 또한 식도에 손상을 일으킨다. 쓴물이 넘어오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고, 음식물만 섭취하면 속이 거북하고 음식이 배에 가득 차서 내려가지 않는다.
한방에서는 이를 담적(痰積) 즉 채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부패해서 만들어진 '담'이 위벽에 쌓이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진단한다. 담으로 인해 점막 조직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산이 원활하게 분비될 리 없다. 여기에 음식이 오랜 시간 위장에 머무르다 보니 또 독소를 생성해내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독소가 쓴물이 되어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침과 달리 위액은 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암모니아 가스도 트림 형태로 올라온다.
바로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식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위점막에서 만들어진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펩신이 단백질 분해효소인 만큼 이는 소화기능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그런데 식초의 산성 성분이 바로 펩신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함께 식초는 살균력이 뛰어나 위산 못잖게 몸에 필요없는 잡균들을 제거한다.
그 외 체지방과 중성지방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피로회복, 혈당강화, 상처회복 등 식초의 각종 효능들은 여기에 언급하는 것이 진부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단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식초의 천연성분이 칼슘섭취를 돕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에도 좋다는 점이다.
식초가 몸속에서 직접적으로 '소화효소'의 역할을 한다면 최근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미밥은 조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산 부족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돕는다. 현미밥의 여러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십 차례 꼭꼭 씹어야 한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소화효소 아밀라아제를 함유하고 있는 침, 즉 타액이다. 아밀라아제는 직접적으로 현미의 탄수화물을 분해해 당으로 만든다. 그런데 타액의 원활한 분비는 마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듯 위산분비는 물론 또 하나의 중요한 소화효소인 담즙과 췌장 췌액의 분비를 촉진한다.
또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미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히스티딘을 위산 분비와 연관 짓기도 한다. 히스티딘은 몸에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분비되는 히스타민의 전구체다.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 바로 눈물이나 타액, 위액 등 몸속의 각종 점액물질 생성을 촉발한다.
내장 비만인 사람들이 위산과다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것도 내장 비만세포 속의 염증성 물질들이 히스타민을 분비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미의 히스티딘 성분이 위산 분비를 도와 위산부족증 환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추론을 내려볼 수 있다.
만약 위산부족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을 겪을 경우 위산과다 분비증 환자에게 처방하듯 제산제를 처방한다면 소화기능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위산부족으로 단백질 대사가 안될 경우 항암세포를 비롯, 몸의 대부분 면역세포들이 단백질로 합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도움말 = 박유경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교수>